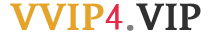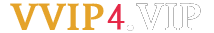한강에 돌아온 야생동물들...카메라에 잡힌 충격적인 순간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생명의 서식지 되살리는 노력 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막개발 중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이자, 서울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유지가 서울시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한강의 모습을 알리고, '우리가 꿈꾸는 한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기자말>
최근 서울 한강변 광나루 드론 비행장에 고라니 떼가 등장했다. 족히 십수 마리는 되어 보이는 고라니들이 예초기로 단정히 관리된 잔디밭에서 새싹을 뜯고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귀엽다, 풀 많이 먹고 가~", "아이들 데려가자", "제발 다치지 마"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한강에 나타난 야생동물의 귀환에 놀라워했고 반가워했다.
그러나 야생의 귀환은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고라니는 산지와 초지의 경계 지대에서 살아가는 사슴류이다. 낮에는 물가 습지나 초지대에서 몇 종류 안 되는 풀을 뜯고, 밤에는 산지로 올라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다.
아무리 물가를 좋아하는 고라니라지만, 한강의 남쪽은 올림픽대로, 북쪽은 강북 강변도로로 막혀 양질의 먹을거리가 있는 산지로 올라갈 수 없다. 산지로 가려면 로드킬의 위협을 무릅써야 한다. 장맛비에 한강이 범람하면 도로 인근의 둔치에서 길이 막혀, 몸 숨길 곳 없이 좁은 곳에 매달려 비를 쫄딱 맞으며 버틴다.
지금의 한강에서는 수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본성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없다. 모래 목욕을 즐기면서 기생충을 털어내고 물기를 말리는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모래톱은 개발과 준설로 인해 한강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수달이 사냥할 수 있는 얕은 여울이 사라져 한강 본류는 이동통로로만 활용하고, 대부분이 사냥이 비교적 쉬운 홍제천,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의 지천으로 옮겨 사는 듯하다. 말하자면 한강에 돌아온 야생동물은 콘크리트를 뜯어낸 빈 틈새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돌아온 야생동물과 공존의 과제는 이제 시작
돌아온 동물들과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생길 갈등도 우려된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는 밀렵으로 사라졌던 오소리들이 돌아오면서 야생-인간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숲에 인접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오소리 물림 사고가 잇따른 것. 하남시는 환경부에 "오소리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사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돌아온 오소리가 인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자, 이제 다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오소리와의 거리 유지 안내, 오소리의 공간 이용 분석, 야생동물 울타리 등 비살상적 해결책들이 있지만, 야생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시 없애자'는 것이었다.
한강 따라 달리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사고가 늘어나면, 너구리가 애완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뱀이나 벌이 늘어나 민원이 증가하면, 서울시는 돌아온 이들 야생과의 공존을 허락할까? 인간이 야생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이런 충돌이 빈번해지면 돌아온 한강의 동물들은 또다시 '관리'와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돌아온 야생의 세계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등을 조율할 '야생-인간 시민 외교관'의 존재다. 현장을 다니며 인간의 필요와 야생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공존의 질서를 조율하는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교의 주역은 한강에 돌아온 야생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간 세계와 야생 세계의 공존을 상상하는 시민들이다. 이 역할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감당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써야 할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늘 현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태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며 야생동물의 안녕을 살피고 모니터링과 조사를 하는 시민과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는 한강에는 그런 시민들이 없다. 오랜 시간 한강 현장을 누비며 활동하던,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의 생태 공간을 지키던 시민들이 쫓겨났다. (관련 기사 : 서울시의 수상한 한강 관리... 한강생태공원 관리 기관들의 집단 반발, 왜?
https://omn.kr/2cjlq)
강을 사랑하는 시민 봉사자들과 한강의 자연을 관찰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의견을 나누던 공간은 서울시의 요구에 사라질 것이다. 생명의 편에 서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그저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야생과 인간을 연결하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린 것과 같다.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는 한강에는 야생동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 야생동물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이자 배경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저 돌아왔으니 그만이라는 것이다. 돌아왔으니 한강의 자연성은 살아난 것이고 생태복원은 성공한 것이다.
맹꽁이가 시설물 배수로에 빠지고 자전거에 치이고, 수달과 고라니가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횡단해도, 멀리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겨울 철새들이 쉬던 잔잔한 수면을 한강버스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만든 설계 도면과 조감도로 그 모습이 결정되는 한강이다. 시민의 목소리와 야생동물의 요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한강의 목소리, 야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야생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백사장 모래톱과 습지, 그리고 생명들의 서식지를 되살릴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한강 르네상스'이며 서울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막개발 중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이자, 서울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유지가 서울시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한강의 모습을 알리고, '우리가 꿈꾸는 한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기자말>
최근 서울 한강변 광나루 드론 비행장에 고라니 떼가 등장했다. 족히 십수 마리는 되어 보이는 고라니들이 예초기로 단정히 관리된 잔디밭에서 새싹을 뜯고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귀엽다, 풀 많이 먹고 가~", "아이들 데려가자", "제발 다치지 마"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한강에 나타난 야생동물의 귀환에 놀라워했고 반가워했다.
그러나 야생의 귀환은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고라니는 산지와 초지의 경계 지대에서 살아가는 사슴류이다. 낮에는 물가 습지나 초지대에서 몇 종류 안 되는 풀을 뜯고, 밤에는 산지로 올라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다.
아무리 물가를 좋아하는 고라니라지만, 한강의 남쪽은 올림픽대로, 북쪽은 강북 강변도로로 막혀 양질의 먹을거리가 있는 산지로 올라갈 수 없다. 산지로 가려면 로드킬의 위협을 무릅써야 한다. 장맛비에 한강이 범람하면 도로 인근의 둔치에서 길이 막혀, 몸 숨길 곳 없이 좁은 곳에 매달려 비를 쫄딱 맞으며 버틴다.
지금의 한강에서는 수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본성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없다. 모래 목욕을 즐기면서 기생충을 털어내고 물기를 말리는 수달이 이용할 수 있는 모래톱은 개발과 준설로 인해 한강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수달이 사냥할 수 있는 얕은 여울이 사라져 한강 본류는 이동통로로만 활용하고, 대부분이 사냥이 비교적 쉬운 홍제천,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의 지천으로 옮겨 사는 듯하다. 말하자면 한강에 돌아온 야생동물은 콘크리트를 뜯어낸 빈 틈새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돌아온 야생동물과 공존의 과제는 이제 시작
돌아온 동물들과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생길 갈등도 우려된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는 밀렵으로 사라졌던 오소리들이 돌아오면서 야생-인간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숲에 인접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오소리 물림 사고가 잇따른 것. 하남시는 환경부에 "오소리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사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돌아온 오소리가 인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자, 이제 다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오소리와의 거리 유지 안내, 오소리의 공간 이용 분석, 야생동물 울타리 등 비살상적 해결책들이 있지만, 야생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시 없애자'는 것이었다.
한강 따라 달리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사고가 늘어나면, 너구리가 애완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뱀이나 벌이 늘어나 민원이 증가하면, 서울시는 돌아온 이들 야생과의 공존을 허락할까? 인간이 야생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이런 충돌이 빈번해지면 돌아온 한강의 동물들은 또다시 '관리'와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돌아온 야생의 세계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등을 조율할 '야생-인간 시민 외교관'의 존재다. 현장을 다니며 인간의 필요와 야생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공존의 질서를 조율하는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교의 주역은 한강에 돌아온 야생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간 세계와 야생 세계의 공존을 상상하는 시민들이다. 이 역할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감당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써야 할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늘 현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태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며 야생동물의 안녕을 살피고 모니터링과 조사를 하는 시민과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는 한강에는 그런 시민들이 없다. 오랜 시간 한강 현장을 누비며 활동하던,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의 생태 공간을 지키던 시민들이 쫓겨났다. (관련 기사 : 서울시의 수상한 한강 관리... 한강생태공원 관리 기관들의 집단 반발, 왜?
https://omn.kr/2cjlq)
강을 사랑하는 시민 봉사자들과 한강의 자연을 관찰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의견을 나누던 공간은 서울시의 요구에 사라질 것이다. 생명의 편에 서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그저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야생과 인간을 연결하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린 것과 같다.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는 한강에는 야생동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 야생동물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이자 배경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저 돌아왔으니 그만이라는 것이다. 돌아왔으니 한강의 자연성은 살아난 것이고 생태복원은 성공한 것이다.
맹꽁이가 시설물 배수로에 빠지고 자전거에 치이고, 수달과 고라니가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횡단해도, 멀리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겨울 철새들이 쉬던 잔잔한 수면을 한강버스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만든 설계 도면과 조감도로 그 모습이 결정되는 한강이다. 시민의 목소리와 야생동물의 요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한강의 목소리, 야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야생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백사장 모래톱과 습지, 그리고 생명들의 서식지를 되살릴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한강 르네상스'이며 서울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